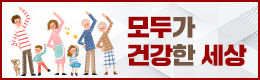한국헬스경제신문 | 정희원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임상조교수
겨울철 체온 조절과 낙상 예방은 노년층 건강에 중요하다. 한창 추위가 맹위를 떨치는 1월까지는 신경을 쓰지만, 날이 풀리는 2월부터는 방심하기 쉽다. 방심은 병을 부른다. 겨울 막바지까지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체온과 건강 관계
흔히 정상 체온으로 36.5℃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36~37.5℃까지는 정상 범위에 속한다. 건강을 위해서는 체온이 정상 범위에 속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는 효소 때문이다. 효소는 우리 몸의 신진대사, 쉽게 말해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또 효소는 호흡, 소화, 혈액순환, 면역체계 등과 관련이 있다. 체온이 정상 범위일 때 효소가 가장 활발하게 일할 수 있다.
누구에게나 겨울은 춥다. 노년층을 딱 꼬집어 이야기하는 것은 나이가 들수록 몸이 추위를 잘 타도록 바뀌기 때문이다. 추울 때 사람의 몸은 대사를 활성화하여 열을 만든다. 이 과정은 근육에서 주로 일어난다. 열 손실을 막는 것은 지방이다. 노화 과정을 거치면서 근육과 지방 모두 감소하므로 추위를 잘 타게 된다.
나이가 들면 지병 하나쯤 가지고 있는 것이 흔한데, 이것도 체온 조절을 방해하는 요소다. 심혈관 질환을 겪는 경우가 그렇다. 혈액을 통해 체온이 조절되기 때문이다. 심장은 혈액을 온몸에 공급하면서 체온 조절에 기여하므로, 심장에 이상이 있으면 추위를 타기 쉽다.
고혈압 및 저혈압, 동맥경화증, 말초동맥 질환, 당뇨병 등의 혈관 질환이 있어도 마찬가지다.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수축·이완 작용을 통해 열을 전달하는 기능이 떨어진다. 고혈압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베타차단제를 처방받아 먹는데, 이 약은 열 생산과 관련이 있는 교감신경을 방해하여 체온을 떨어뜨린다.
추위를 타는 또 다른 원인
뇌에 문제가 있어도 추위를 타게 된다. 뇌의 운동 중추에 이상이 있으면 체온이 떨어져도 근육에 열을 내라고 신호를 주기 어렵다. 이런 증상이 생기는 병으로는 뇌졸중, 치매, 파킨슨병 등이 있다. 뇌에서 제대로 명령했어도 기관에서 못 알아듣는 경우도 있다. 갑상선 질환이 생기면 그렇다.
갑상선은 체온을 조절하라는 뇌의 신호에 따라 갑상선호르몬의 분비를 조절하여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갑상선 질환을 앓으면 체온 조절이 어려운 이유다. 지병이라고 하기는 뭣한 작은 질환을 앓고 있어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흔히 먹는 소염진통제 (NSAIDs, 비스트레이드성 항염증제. 대표적인 것으로 이부프로펜 성분을 기반으로 하는 약제) 또는 해열진통제(아세트아미노펜 성분 기반 약제)의 기전 때문이다. 이 약들은 열을 생산하는 과정에 간여해 작용하므로 체온 상승을 방해하게 된다. 감기, 두통, 퇴행성 관절염 등에 이 약을 주로 먹는다.
그렇다면 체온을 조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최대한 열 손실을 막을 수 있게 차려입는 것이 중요하다. ‘얼죽코(얼어 죽어도 코트)’나 ‘얼죽아(얼어 죽어도 아이스아메리카노)’는 피하자. 패딩을 입고 따뜻한 음료를 드시라. 패딩의 경우 보온성이 뛰어난 소재이면서 가벼운 것이 좋다. 두껍고 무거운 패딩은 움직임을 방해한다.
패딩 안에는 손쉽게 입고 벗을 수 있는 얇은 옷을 여러 벌 입고, 내복도 입는 것이 체온 조절과 움직임에 좋다. 입고 나갔다가 더우면 한 벌씩 벗어 가방 등에 넣으면 그만이다. 실험 결과 체온 손실의 50~75%는 머리와 목에서 일어난다고 한다. 군밤 장수 하면 떠오르는 머리와 귀를 가릴 수 있는 모자나 발라클라바(스키 마스크)를 쓰자.
목 보온의 경우 요즘 간편하게 고정할 수 있는 패딩 목도리가 많이 나왔다. 목도리를 하는 게 귀
찮다면 아예 목을 가리는 터틀넥(폴라) 형태의 옷을 입어도 좋다. 소홀히 하기 쉬운 하지 보온도 중요하다. 내복 또는 방한용 레깅스를 착용하고, 색스니 피니시(기모) 처리가 된 바지를 입으면
도움이 된다. 발의 경우 두꺼운 양말 한 켤레보다는 얇은 양말을 두어 켤레 겹쳐 신고 겨울용 방한화를 신으면 좋다.
일상생활에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집 앞에 쌓인 눈 치우는 것은 조심하는 편이 좋다. 그렇잖아도 추위 때문에 과로하는 심장에 무리를 주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장시간 추위에 노출되고 나서 바로 샤워나 목욕을 하는 것은 피하여야 한다. 영화 <러브 레터>에서 주연을 맡았던 일본 배우 나카야마 미호가 작년 말 고작 54세의 나이로 급사했다. 그녀의 사인이 이것으로 추정되어 충격을 주었다. 인간의 신체는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에 매우 민감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노년층 체온 조절과 낙상 예방
체온 조절은 낙상 예방과도 연관이 있다. 앞에서 따뜻하면서도 활동성이 좋도록 입는 것을 권장했는데,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둔하게 입으면 자칫 낙상 사고를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낙상은 넘어지거나 떨어져서 몸을 다치는 것을 뜻한다. 높은 곳에서의 추락이나 미끄러져 넘어지는 것도 포함한다. 원인은 다양하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약 35~40%가 연간 한 차례 이상 낙상을 경험한다. 낙상은 단순히 넘어지는 것이 아니다. 노년층은 뼈가 약해져 있어, 자칫 대퇴부나 고관절(엉덩이뼈) 등의 골절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수술이 필요한데 자칫 드러누워 지내는 형편이 되기 쉽다. 따라서 낙상은 예방이 최선이다.
집 밖에서는 주로 눈이 온 뒤 길이 얼었거나 물기가 있을 때 넘어지기 쉽다. 신발에 아이젠 등을 착용하고, 필요하다면 등산용 스틱을 쓰는 것도 좋다. 남의 눈치를 보느라 건강을 해치는 우를 범하는 것은 어리석다. 의외로 실내에서도 낙상이 잦다. 주로 침실, 욕실, 부엌에서 발생한다. 10% 정도는 계단을 내려가면서 발생한다고 한다.
아침에 일어나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밤에 화장실을 가다가 흔히 발생한다. 밤에도 간접 조명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좋고, 욕실이나 부엌 등 바닥이 미끄러운 곳에는 벽에 손잡이를 달거나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자. 지병이 있는 사람들 역시 낙상을 조심하자. 병 자체뿐 아니라, 치료를 위해 먹는 약물의 부작용으로도 낙상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알츠하이머약의 성분인 갈란타민, 도네페질, 리바스티그민 등은 어지러움이나 운동 기능 장애를 일으킨다. 당뇨 합병증으로 흔히 말초신경증이 오는데, 이때 쓰는 약의 성분인 가바펜틴, 프레가발린 등도 마찬가지다. 신경계에 작용하는 마약성 진통제(트라마돌 성분), 삼환계 항우울제(아미트립틸린 성분), 수면제나 신경안정제로 쓰는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제와 졸피뎀 등도 낙상을 유발할 수 있다.
정신 운동성 주의력을 떨어뜨리고 운동 반사를 둔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외에 항부정맥제, 이뇨제, 항고혈압제도 주의 대상이다. 그렇다고 약을 임의로 끊어서는 안 될 일이다. 약을 제대로 먹
지 않아 증세가 심해지면 무슨 소용이겠는가?
이성부 시인은 「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도 오는 게 봄이라고. 봄이 오기 전 서두를 필요가 없는 이유다. 조금만 참으시라
* 이 기고는 대한보건협회 <더행복한 건강생활>과 함께 제공됩니다.